교과서5종(천재▷비상▷미래엔▷교학사▷씨마스)▶현자의돌 선생님, Hamartia 선생님 제시문모음▶ 『2024 김병찬 교수의 서양.동양.한국윤리: 중등임용 시험대비』
# 주희 저작들 어떻게 인용하는 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찾아보는 건지도 모르겠고...
# 학부 수업에서 성즉리 같은 거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노트들 찾아보기 귀찮고... 학부 선생님들 수업 노트랑 책들, 김병환 교수님 책 등으로 보완하면 좋을 듯. 실제 가르칠 때 쓸 만한 더 깔끔한 설명들을 찾고 싶다.
# 중화구설신설 보충하자..
1. 리기론
- 주희는 세계와 만물을 리와 기로 설명함. 만물은 리기의 결합으로 이루어짐(리기로 구성됨).
- 리: 세계와 만물의 자연법칙 또는 원리[소이연지리]이면서 인간이 따라야 할 당위 규범[소당연지리]. 형체나 작용이 없음(형이상자). 순수지선함.
- 기: 만물을 구성하는 재료나 도구(리가 현상으로 드러나기 위한 재료이자 힘). 형체를 지니고 운동·변화하는 형이하자.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은 기의 맑고 흐림 또는 온전하고 치우침[청탁수박]의 차이가 있음. 악, 불선, 불완전성의 근원.
- 리기는 의미와 역할이 다르므로 개념적으로는 구분되나[불상잡], 모든 존재와 현상이 리기의 결합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서 리기는 서로 분리되지 않음[불상리].
- 음양의 동정 운동 자체는 기에 속하지만, 동정 운동의 까닭은 리임.
천지간에는 이도 있고 기도 있다. 이는 형이상의 도이고, 사물을 생성하는 근본이다. 기는 형이하의 기(器)이고, 사물을 생성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물이 생성될 때는 반드시 이를 부여받은 뒤에 성(性)이 있고, 기를 부여받은 뒤에 형체가 있다. (天地之間 有理有氣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 是以人物之生 必稟此理 然後有性 必稟此氣 然後有形) (『주문공문집』, 답황도부)
이와 기는 확실히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체이다. 다만 사실상으로 보면 이와 기는 서로 뒤엉켜 있어서 각각 따로 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주문공문집』 ?)
기는 이에 따라 작용하는 듯하다. 기가 응집되면 이도 거기에 존재한다. 기는 응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반면에, 이는 의지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조작도 없다[蓋氣則能凝結造作 理卻無情意 無計度 無造作]. 다만 이 기가 응취(凝聚)하는 곳에 이는 곧 그 가운데 있다. 가령 천지 안에서 사람, 만물, 초목, 금수가 태어남에 씨앗이 없는 것이 없거니와, 씨앗 없는 백지상태에서 하나의 물사(物事)가 생겨날 수는 없으니 이것이 기이다. 이는 정결공활한 세계로서 형체와 자취도 없고 조작할 줄도 모른다. 기는 조화롭게 뒤섞이고 응취하여 물(物)을 낳을 수 있다, 단 이 기가 있으면 이는 곧 그 가운데 있다. (『주자어류』, 이기상, 태극천지상)
태극이란 본연의 오묘함이고, 움직임과 고요함[動靜]이란 (태극이) 타는 틀이다. 태극은 형이상의 도이고 음양은 형이하의 기(器)이다. 그러므로 그 드러남의 관점에서 보면, 움직임과 고요함이 때가 같지 않고 음과 양이 위치가 같지 않지만 태극이 있지 않음이 없다. 그 은미함의 관점에서 보면 텅 비고 고요하여 아무런 조짐이 없는 가운데 움직임과 고요함, 음과 양의 리가 이미 모두 그 가운데 구비되어 있다. (蓋太極者, 本然之妙也, 動靜者, 所乘之機也. 太極, 形而上之道也, 陰陽, 形而下之器也. 是以自其著者而觀之, 則動靜不同時, 陰陽不同位, 而太極無不在焉. 自其微者而觀之, 則沖漠無朕, 而動靜陰陽之理已悉具於其中矣.) (태극도설)
음양은 기이고, 음양의 까닭(所以)은 도이다. (?)
오행의 변화는 무궁한데 어느 경우든 음양의 도가 아님이 없으며, 그 음양이 되는 까닭은 또한 어느 경우든 태극의 본연이 아님이 없다. (?)
태극의 극이란 지극의 뜻이며, 표준의 이름이다. 태극은 항상 사물의 중앙에 있어서 사방에서 바라보고 바름(正)을 취하는 것이다. (?)
사람이 태어난 것은 이와 기가 합해졌기 때문이다. 하늘의 이는 진실로 광대하여 끝이 없지만, 기가 없다면 이가 있더라도 머무를 곳이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양의 두 기가 교감하여 엉키고 맺혀서 모인 뒤에야 이가 머무를 곳이 있게 된다. 대체로 사람이 말하고 움직이며 생각하고 도모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기인데, 그 때 이는 거기에 존재한다. (...) 그러나 두 기와 오행이 교감하여 여러 가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사람과 만물이 생길 때 정밀하거나 엉성한 차이가 있게 된다. 하나의 기로써 말하면 사람과 만물은 모두 기를 받아서 태어난다. 정조(精粗)의 차이로써 말한다면 사람은 정통한 기를 얻고, 사물은 편새(偏皇)한 기를 얻는다. 오직 사람만이 올바른 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가 통하여 막히지 않는다. 사물은 치우친 기를 얻었기 때문에 이가 막혀서 지혜가 없다. (...) 만물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도 단지 일부분만 통할 수 있는데 불과하다. 가령 까마귀가 효도할 줄 알고 수달이 제사지낼 줄 알고, 개는 단지 지키고 막을 수 있고 소는 단지 밭을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사람이 품부받은 것으로 말하면 또한 혼명청탁(昏明淸濁)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태어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자질은 기가 청명하고 순수하여 조금도 어둡거나 흐리지 않다. (?)
- "태극은 리이고, 동정은 기이다." (동정하는 것은 기, 동정하는 까닭은 리.)
(on 주돈이 태극)
『대전(大傅)』에서 형이상의 것을 도라 한다고 이르고서 다시 또 말하기를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진실로 음양을 형이상의 것으로 여긴 것이겠는가?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비록 형기(刑器)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도록 시키는 것은 도의 본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의 본체의 지극함을 일러 태극이라고 하며 태극이 유행하는 것을 일러 도라고 하니, 비록 이름은 둘이나 본래부터 체(體)가 둘인 것은 아니다. 주자(周子)가 무극(無極)을 말한 것은, 그것이 방향도 처소도 없고 형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물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사물이 있은 후에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음양의 밖에 있으면서 음양 중에서 행해지지 않음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체를 관통해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처음에 무성(無聲)·무취(無臭)·무영향(無影響)을 말한 것이다. 이제 무극이 그러하지 않다고 맹렬하게 비난한다면 이는 바로 태극에 형상이 있고 방향과 처소가 있다고 보는 것이 되며 음양을 형이상의 것이라 하게 되니, 곧 도와 기(器)의 구분이 어렵게 된다. (?)
천지의 사이에는 다만 동·정의 양단이 끊임없이 순환할 뿐, 그 밖의 다른 일은 없으니, 이것을 ‘역(易)’이라 하다. 그런데 그 동정에는 반드시 동정하는 까닭으로서의 이가 있으니, 이것이 이른바 태극이다. ‘태극이 동정을 품고 있다(大極含動靜)’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태극에 동정이 있다(大極有勤靜)’라고 말하는 것도 옳다. 그러나 만약 ‘태극이 문득 동정한다(大極便是動靜)’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요, ‘역에는 태극이 있다’라는 말도 군더더기가 되는 것이다. (?)
태극은 사람과 같고, 동정은 말과 같다.
- 리선기후: 아직 사물이 없더라도 리는 있음 (사실의 측면에서 리기는 동시공존하기에 시공간적 선후가 없지만, 논리적 관점에서 리는 기에 앞섬)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이치가 있었다. 예컨대 아직 임금과 신하가 없었을 때도 군신의 도리는 먼저 있었으며, 아직 부자가 없었을 때도 부자의 이치는 먼저 있었다. (『주자어류』 ?)
인간이 배와 차를 만들기 이전에도 이미 배와 차의 이(理)는 존재했다. 우리는 배와 차를 발명했다고 말하지만, 실은 배와 차의 ‘이’를 발견한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서 이런 사물들을 만든 것일 뿐이다. (?)
묻기를 “이가 먼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가 먼저 있는 것입니까?” 답하기를 “이는 일찍이 기와 분리된 적이 없다. 그러나 이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니, 형이상과 형이하의 관점에서 말하면 어찌 선후가 없겠는가?”
묻기를 “반드시 먼저 이가 있고 난 다음에 기가 있는 것입니까?” 답하기를 “이것은 본래 선후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 소종래(所從來)를 추론하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먼저 이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
이른바 이와 기는 결단코 이물(二物)이다. 다만 사실적 관점에서 보면 이와 기가 섞여 있어, 각각 한 곳에 있는 것을 분개(分開)할 수 없다. 그러나 이기가 각각 일물이 됨을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논리적 관점에저 본다면 비록 사물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물의 이는 이미 존재한다. (?)
- 리일분수: 이치는 본래 하나이지만 현상적으로는 나뉘어 다름. (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편성과 특수성을 설명) 만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그대로 품수하여 자신의 체로 삼고 있음. 하나의 태극은 서로 다른 기를 지닌 천지만물에게로 품수되어 각각의 리를 형성함.
천하의 리가 만 가지로 다르지만 그 귀결은 하나일 뿐이며 둘도 셋도 아니다.
(말라 시들어진 물건을 포함한) 모든 것이 처음 생겨날 때부터 이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천하에 그 본성이 없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주자어류』 ?)
위로는 무극과 태극에서, 아래로는 하나하나의 초목과 곤충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이(理)가 있다. 사물 하나를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사물의 도리 한 가지를 빠뜨린다. 모름지기 한 가지를 따라가서 다른 이(理)와 만나야 한다. (?)
마치 곡식 낟알 하나가 자라서 모가 되고, 모가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열매를 맺어 곡식을 이루고, 다시 본래의 형체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삭 하나에 백 개의 낟알이 있으니 낟알마다 완전하고 또 장차 이 백 개의 낟알이 씨로 뿌려져 또 각각 백 개의 낟알을 이루니 낳고 낳음이 그치지 않음은 처음에 이 낟알 하나가 나누어져 간 것이다. 사물마다 각각 ‘이’가 있으나 총합하면 단지 하나의 ‘이’일 뿐이다. (『주자어류』 ?)
답하기를 "만물 모두에 각각의 리가 있다. 리는 모두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같게 난 것이다. 그러나 사물들이 위치한 자리는 같지 않다. 즉 그 리의 활동은 같지 않은 것이다. 임금은 어짐과 신하는 공경하고 아들은 효하고 부모는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사물들 각각은 리를 가지고 있으나 그 사물의 각리의 작용은 다르다. 때문에 "하나의 리의 유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曰:「萬物皆有此理,理皆同出一原。但所居之位不同,則其理之用不一。如為君須仁,為臣須敬,為子須孝,為父須慈。物物各具此理,而物物各異其用,然莫非一理之流行也。) (『주자어류』, 대학오혹문하, 전호장, 독기소위격물치지일단, 28)
본래 다만 하나의 태극인데 만물이 각각 품수한 것이요, 또 각자 하나의 태극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일 뿐이나, 강과 호수에 산재하게 되면 곳에 따라 드러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달이 이미 나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처한 지위가 다르면 그 이치(理)의 쓰임도 한결같지 않다. 예를 들어 임금이 되어서는 어질어야 하고, 신하가 되어서는 공경해야 하며, 자식이 되어서는 효도해야 하고,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로워야 한다. 사물마다 각각 이치를 갖추고 있고 사물마다 각각 그 쓰임이 다르지만 일이(一理)의 유행이 아님이 없다. (『주자어류』 ?)
이(理)는 단지 하나일 뿐이니 도리는 같으며 그 분(分)은 다르다. 군신에게는 군신의 이가 있고, 부자간에는 부자의 이가 있다. (?)
하나의 실상이 만 가지로 나뉘어져 만과 하나가 각각 바르게 되니 바로 이일분수이다. (...) 예컨대 이 널빤지는 하나의 도리이지만 이 결은 이렇게 가고 저 결은 저렇게 간다. 예컨대 한 채의 집은 단지 하나의 도리이지만 대청이 있고 본채가 있다. 가령 초목은 다만 하나의 도리이지만 복숭아나무가 있고 오얏나무가 있다. 여기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도리일 뿐이지만 장씨가 있고 이씨가 있어서 이씨는 장씨가 될 수 없고 장씨는 이씨가 될 수 없다. 가령 음양(陰陽)의 예를 들더라도『서명』의 이일분수를 말한 것이 또한 이와 같다.
태극은 단지 천지만물의 이일 따름이다. 천지에서 보면 천지 안에 태극이 있고, 만물에서 보면 만물 가운데 각기 태극이 있다. (太極只是天地萬物之理. 在天地言, 則天地中有太極; 在萬物言, 則萬物中各有太極) (『주자어류』, 이기상, 태극천지상, 1)
이기오행(二氣五行)은 하늘이 만물에 품부하여 생긴 것이다. 그 말단으로부터 근본을 좇으면 오행의 다름은 이기(二氣)의 실(賞)을 근본으로 하고 이기의 실은 일리(一理)의 극을 근본으로 한다. 이것은 바로 만물을 합해 말하면 하나의 태극(萬物統體一太極)으로서 동일한 것이다. 그 근본으로부터 말단으로 가면 일리의 실이 만물로 나뉘어 그 체(體)가 된 다. 그러므로 만물 가운데 각각 하나의 태극이 있는 것이다(一物各具一太極). 크고 작은 물건들이 모두 그 일정한 분(分)을 가지고 있다.
오행(五行)이 생김에 각각 하나(大極, 理一)가 그 성(性)이 된다. 기가 다르고 질이 다르지만 각각 그것을 하나로 가져서 거짓 빌리는 것이 없다. (?)
만과 일이 각기 바르면 대소에 정함이 있다. 만을 하나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를 만이라고 할 수 있다. 본체를 통합한 것이 하나의 태극이지만, 또 일물(一物)도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다. (?)
“『리성명(理性命)』 주(注)에서 선생님께서는 ‘그 근본으로부터 말단으로 가면 일리(一理)의 실(實)이며 만물로 나뉘어져 체(體)가 된다. 그러므로 만물이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셨는떼, 그렇다면 태극이 나뉜다는 것입니까?” “근본은 다만 하나의 태극이고 만물에는 각기 그 품부받은 것이 있으며, 또 스스로 각기 하나의 태극을 완전히 갖추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하나의 태극이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심성론
- 성즉리: 사람의 본성은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와 일치함(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리임) (도덕 실천의 근거를 자연의 이치와 연결하여 강조) (사람의 본성은 인의예지의 사덕)
성(性)이란 사람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理)여서 온전하게 선하다. 보통 사람들은 사욕에 빠져 그것을 잃지만 성인(聖人)은 사욕의 폐단이 없어서 그 본성을 실현해 낼 수 있다. (?)
성(性)은 곧 이(理)다. 그러나 왜 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이라고 말했을까? 이는 범칭으로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과 만물의 공공적인 것을 말하지만, 성은 나에게만 있는 이(理)며 하늘에서 받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기(氣)가 있으면 반드시 그 이(理)가 있다. 맑은 기를 타고난 사람은 성현인데, 이는 마치 보석이 맑고 깨끗한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반면에 탁한 기를 타고난 사람은 우매한 사람인데, 이는 마치 보석이 탁한 물속에 있는 것과 같다. (『주자어류』 ?)
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면 이치 또한 부여받는데, 각각 부여받은 이치를 본성으로 삼는다. 기질의 맑고 탁한 차이로 인해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생겨난다. 사람은 기질의 차이에 따라 선을 행하기도 하고 불선을 행하기도 한다. (?)
인간과 사물이 천지 사이에서 생겨날 때, 이(理)는 동일하지만 품수한 기(氣)는 서로 다르다. 인간은 기의 바름과 통함을, 사물은 기의 치우침과 막힘을 얻었다. 이것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유이다. (?)
이 기가 있지 않을 때에도 이미 이 성(性)은 존재하며, 기가 없어져도 성은 도리어 항상 존재한다. 성은 비록 기 가운데 존재해도, 기는 스스로 기이고 성은 스스로 성이어서, 또한 서로 협잡하지 않는다. (?)
하늘이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함에, 기로써 형체를 이루고 이 또한 부여하였으니, 명령한 것과 같다. 이에 인간과 만물이 태어남에 각각 부여받은 이에 따라 건순과 오상의 덕을 삼으니, 이른바 성이다. (?)
이어가는 것이 선이요 이루는 것이 성이라고 하였으니, 이가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선이요 불선이 없으며 사물이 생겨나서 비로소 성이라 부르게 된다. 다만 이 이가 하늘에 있으면 명(命)이라 하고, 사람에 있으면 성이라 하는 것이다. (?)
하늘이 만물을 낳음에 각각 하나의 본성을 부여했다. 성은 사물이 아니요, 다만 내 안에 있는 하나의 도리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성의 본체는 다만 인의예지신 다섯 글자일 뿐이니, 천하의 도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 천명지성과 기질지성: 인간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이치인 본연지성과, 그러한 이치가 기질에 부여된 기질지성이 있음(기질의 영향을 받는 현실적 본성). 본연지성은 기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리만을 조명한 것으로, 순선무악함. 기질지성은 기 속에 리가 부여된 상태의 본성을 지칭하는 것(리와 기를 겸하여 말한 것)으로, 선과 악이 섞여 있음. 기질지성은 타고난 기질의 맑고 탁함에 따라 사람마다 다름. 수양의 목표는 기질을 조절하여 본연지성을 회복하는 것. (기질지성 속에는 이와 기가 함께 섞여 있고, 그중 이만을 가리켜 본연지성이라고 함)
본연지성은 오직 이(理)만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고 기질지성은 이와 기를 섞어서 말한 것이다. 성(性)은 곧 이(理)이다. 마음[心]에서는 성이라고 부르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부른다.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오로지 선하다. 부자(父子) 사이에는 부자의 이가 있고, 군신(君臣) 사이에는 군신의 이가 있다. (?)
이치[理]가 천지 사이에 있을 때에는 선(善)일 뿐이고, 만물이 생길 때 비로소 본성[性]이라 부르게 되며, 마음[心] 안에 이치가 있게 된다. 이치가 곧 본연지성(本然之性)이고, 이치와 기질[氣]이 결합하여 기질지성(氣質之性)이 있게 된다. (?)
성(性)을 논하고 기(氣)를 논하지 않으면 완비된 것이 아니고, 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밝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대개 ( 본연지성 )은/는 다만 지극한 선(善)일 뿐이어서 기질을 가지고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어두움과 밝음, 통함과 막힘,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완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단지 ( 기질지성 )만을 논하고 그것을 본원의 측면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비록 어두움과 밝음, 통함과 막힘, 단단함과 부드러움,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겠지만, 지극히 선한 근원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밝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이다. 반드시 성과 기를 함께하여 그것을 본 연후에야 다했다(盡)고 할 것이다. 즉 성은 기이고 기는 성이다. (「論性不論氣,不備;論氣不論性,不明。」蓋本然之性,只是至善。然不以氣質而論之,則莫知其有昏明開塞,剛柔強弱,故有所不備。徒論氣質之性,而不自本原言之,則雖知有昏明開塞、剛柔強弱之不同,而不知至善之源未嘗有異,故其論有所不明。須是合性與氣觀之,然後盡。蓋性即氣,氣即性也。) (『주자어류』, 맹자 9, 고자상 성무선무불선장 25)
성을 논하고 기를 논하지 않으면 타고난 기질의 차이를 알 수 없으며,기를 논하고 성을 논하지 않으면 의리의 같음을 알 수 없다. (?)
성은 다만 이(理)일 뿐이다. 그러나 저 천지의 기질이 없다면 이 이는 안둔처가 없게 된다. 청명한 기질을 얻으면, 이를 가리거나 가두지 않아 이 이가 순조롭게 발현된다. 가리고 가둠이 적은 경우에는 발출할 때에 천리가 이기고, 가리고 가둠이 많으면 사욕이 이긴다. 이로써 본원의 성은 순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맹자가 말한 ‘성선’이나, 주자(周子)가 말한 ‘순수지선’, 정자(程子)가 말한 ‘성의 본연’, 그리고 ‘반본궁원(反本窮源)의 성’ 등이 그것이다. 다만 기질의 혼탁으로 인해 본연지성이 가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질지성은 군자의 성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학문을 통해 본원으로 돌이킨다면 천지지성이 보존된다. 그러므로 성을 논할 때에는 반드사 기질을 함께 논해야 바야흐로 갖추어지는 것이다.
대저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결코 두 사물이 아니다. (?)
기질은 음양오행의 소산이며 성은 태극의 온전한 체이다. 다만 기질지성은 이 온전한 체가 기질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일 뿐이니, 별도로 하나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
마른 나무는 기질지성만 있고 본연지성이 없다고 하니 이 말은 더욱 가소롭다. 만약 이와 같다면 사물에는 하나의 성만 있고 사람에게는 두 성이 있는 것이 된다. 그 말이 이처럼 어그러지게 된 것은, 대개 기질지성이란 것이 이가 기질 중에 떨어져서 기질을 따라 스스로 하나의 성이 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주자(周子)가 말한 바 각기 하나의 성이 그것이다. 만약 본연지성이 없다면 이 기질지성은 또 어디에서 왔겠는가? (?)
- 심통성정: 마음이 성과 정을 주재하고 포괄함[심통성정]. 성이 발하여 정이 됨[성발위정]. 마음[心]의 본체가 성(性)이며 그 작용은 정(情)임. 성은 인의예지의 사덕을 가리키며, 정은 순선한 사단과 선악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칠정을 가리킴
마음은 몸을 주재하는 것으로, 그 본체는 성(性)이고 작용은 정(情)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統]하고, 그 밝은 덕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만사에 감응하지 않음이 없다. (?)
성은 심(心)이 가지고 있는 이(理)이고, 심은 이가 모이는 곳이다. 성은 이이고 심은 이것을 포함하여 싣고 있다가 펴서 베풀어 쓰는 것이다. 즉 움직이는 곳은 심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이다. 마음[心]은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고 의(意)는 마음이 발현한 것이며, 정(情)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마음을 떠나서는 성(性)을 알 수 없다. 성은 마음의 이(理)이고 정은 성의 작용이며, 마음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 성이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지 저 측은해 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등과 같은 네 가지 선의 단서를 보고 그 성이 선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가지 선의 단서는 정이며, 성은 이이다. 발동한 것은 정이고 그 근본은 성이다. 마음이 온갖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온갖 도리를 구비했기 때문이다. …… 어떻게 인의예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측은지심에 근거하여 인(仁)이 있음을 알고, 수오지심에 근거하여 의(義)가 있음을 안다.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이다. 성은 만질 수 있는 모습이나 그림자가 없고 오직 그 이(理)가 있을 뿐이다. 오직 정(情)만 직접 발견할 수 있는데,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가 바로 그 정이다. (『주자어류』 ?)
인의예지(仁義禮智)는 ( 성 )이고, 측은수오사양시비(惻隱羞惡辭讓是非)는 ( 정 )이다. 인(仁)으로 사랑하고 의(義)로 미워하며 예(禮)로 사양(辭讓)하고 지(智)로 아는 것이 마음[心]이다. … (중략) … 마음은 ( 성 )와/과 ( 정 )을/를 주재(主宰)한다. (?)
측은·수오·사양·시비는 정이다. 인·의·예·지는 성이다. 마음은 성과 정을 거느리는 것이다. 단(端)은 실마리이다. 정의 드러남으로 인하여 성의 본연을 볼 수 있는 것은 물건이 가운데 있어서 그 실마리가 밖으로 보이는 것과 같다. (?)
주자(朱子)가 말하였다. 원형이정(元亨利貞)은 성(性)이요 생장수장(生長收藏)은 정(情)이니 원(元)으로써 태어나고 형(亨)으로써 자라고 이(利)로써 거두고 정(貞)으로써 간직하는 것은 마음이요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성(性)이며 측은(惻隱)과 수오(羞惡)와 사양(辭讓)과 시비(是非)는 정(情)이니 인(仁)으로써 사랑하고 의(義)로써 미워하고 예(禮)로써 사양(辭讓)하고 지(智)로써 아는 것은 마음이다. 성(性)은 마음의 이치(理致)요 정(情)은 마음의 용(用)이니 마음은 성정(性情)의 주인이다. (『성학십도』, 심통성정도)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모두 본성에 갖추어져 있으나 그 형체가 혼연하여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에 감촉하여 움직인 뒤에야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의 단서도 그때 형상을 드러내니 이를 정(情)이라 합니다. (『주자대전』 ?)
무릇 인의예지는 사람 마음에 갖추어져 있으니 성의 본체이다. 바야흐로 그 미발의 때에는 막연하여 형상을 볼 수 없으나, 발하여 작용이 됨에 이르러서는 인은 측은, 의는 수오, 예는 공경, 지는 시비가 되어 일을 따라 발현된다. 각기 싹터 나오는 맥이 있고 섞여 혼란하지 않으니 이것이 이른바 정이라는 것이다. (...) 대개 사단의 미발은 비록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않으나 그 가운데 스스로 조리와 짜임새가 있으니, 멍하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다. 밖에서 감하자마자 그 안에서 곧 응하는 근거가 되니,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일에 감하면 인의 이가 곧 응하여 측은지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또 종묘나 조정을 지나가는 일에 감하여 예의 이가 즉시 응하여 공경지심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과 같다. 대개 그 안에 중리(衆理)가 혼연히 갖추어져 있음이 각각 분명하므로 바깥에서 만나는 것이 있으면 감한 것을 따라 응하는 것이다. (?)
마음[心]은 사람의 신묘하고 밝은 곳이다. 뭇 이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온갖 일에 대응한다. 성(性)은 마음이 갖추고 있는 이(理)이고, 정(情)은 마음의 작용이다. (?)
마음은 성과 정(情)을 통괄한다. 하늘이 만물을 생성함에 기(氣)로 형체를 만들고 성 또한 부여하였다. 기질의 차이로 누구나 성이 고유함을 알아 온전하게 할 수는 없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窮理]해야 앎을 지극히 할 수 있다.
성(性)은 하나일 뿐이다. 그 형체를 말할 때에는 하늘이고,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때에는 성이며, 한 몸을 주재한다는 점에서는 마음[心]이다. 마음이 발하여 부모를 만났을 때에는 효, 임금을 만났을 때에는 충이라고 한다.
성(性)은 심(心)의 이(理)이고 정(情)은 심의 활동이다. 재(才)는 그 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정과 재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다만 정은 사물을 만나 발현되어 물결처럼 진행하는 것이라면, 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요컨대 천 갈래 만 갈래의 복잡한 실마리들이 다 심에서 나온다. (性者,心之理;情者,心之動。才便是那情之會恁地者。情與才絕相近。但情是遇物而發,路陌曲折恁地去底;才是那會如此底。要之,千頭萬緒,皆是從心上來) (『주자어류』, 성리2, 성정심의등명의, 93)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마음이고, 움직이는 것은 정이다. 정은 성에 근원하면서 마음의 주재를 받는다. 마음이 주재하면 그 움직임이 중절(中節)하게 되니 어찌 인욕이 생기겠는가? 오직 마음이 주재하지 않으면 정이 스스로 움직여 인욕으로 흘러 늘 바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천리·인욕과 중절·부중절의 나뉨은 다만 마음의 주재 여부에 달리 것이요, 정이 그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님이 또한 분명하다. (...) 이제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갑자기 봄은 마음의 지각이며, 반드시 두려워하며 측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정의 움직임이다. 그것을 계기로 아이의 부모와 교제를 맺으려 한다든가 명예를 얻으려 한다든가 비난하는 소리를 싫어하는 것은 등은 마음이 주재하지 않음으로써 정이 그 바름을 잃은 것이다. (?)
성은 선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마음이 드러나서 정이 되면 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선하지 않은 것은 마음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마음의 본래 모습은 선하지 않음이 없으나 그것이 흘러서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정이 외물에 옮겨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성은 이(理)의 총체적인 이름이며, 인의예지는 성 가운데의 하나의 이의 명칭이다. 측은, 수오, 사양, 시비는 정이 발한 바의 명칭이니 그것은 성에서 나와 선한 것이다. 그 단서의 발한 것이 매우 미세하지만, 모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마음이 성과 정을 통섭한다고 말했으니, 성이 따로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마음은 성과 정을 갖추고 있다. 마음이 그 주재성을 잃으면 오히려 선하지 않을 때가 있다. (?)
마음은 성과 뗄 수 없음:
마음과 성은 어느 하나를 말하면 다른 하나가 따라 나오니, 원래 서로 떨어질 수도 없으며, 역시 본디 구별하기도 어렵다. 마음을 버리면 성을 볼 수 없고, 성을 버리면 또한 마음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맹자는 마음과 성을 말할 때 언제나 연결 지어 말했다. (...) 마음과 성 그리고 이는 한 가지만 집어 들면 나머지가 모두 꿰어지니 오직 그것이 가리키는 바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살필 따름이다. (?)
- 인심도심: 사욕을 충족하려는 마음인 인심(人心)과 도덕 법칙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인 도심(道心)이 인간 안에서 갈등함. 두 마음을 잘 분별하여 도심이 인심을 잘 통제하고 인심은 도심의 명령을 잘 듣도록 해야 함. (인심: 감각적 욕구를 지각하는 마음 / 도심: 천리 혹은 도의를 지각하는 마음, 의리의 공평무사함에서 발하는 마음, 지각이 의리를 좇아가는 마음)
이 마음의 신령함에 있어서 그 지각이 이(理)에 있는 것이 도심이요, 그 지각이 욕(慾)에 있는 것이 인심이다. (...) 단지 하나의 마음이지만, 지각이 귀와 눈의 욕구를 따라가면 인심이 되고 지각이 의리를 따라가면 곧 도심이 된다.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마음이 있을 뿐이다. 다만 지각이 도리를 얻으면 도심이 되고, 지각이 소리, 색, 냄새, 맛 같은 것을 얻으면 인심이 된다. 마음의 허령한 지각은 하나일 뿐이다. 인심과 도심의 다름이 있다고 한 것은, 혹은 그것이 형기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혹은 성명의 바름에서 생겨서 지각한 것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은 위태하고 불안하고 혹은 미묘하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나 사람은 형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비록 상지(上智)라도 인심이 없지 않고, 또한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이 없으므로 비록 하우(下愚)라도 도심이 없지 않다.
인심을 인욕이라 한다면 이 말에는 잘못이 있다. 비록 상지(上智)라도 이것이 없을 수 없으니 어찌 전적으로 옳지 않다고만 하겠는가? (...) 인심은 완전히 좋지 않은 인욕인 것이 아니라, 단지 배고플 때 먹고자 하고 추울 때 옷을 입고자 하는 마음일 뿐이다.
물었다. “배고플 때 먹고 목마를 때 마시는 것, 이것은 인심이 아닙니까?” 대답했다. “그렇다. 그런데 반드시 그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고 마땅히 마셔야 할 것을 마시면 이른바 도심을 잃지 않게 된다. 만일 훔친 샘물을 먹거나 욕하며 주는 음식을 먹으면 인심이 이기고 도심은 없어지게 된다.” 물었다. “인심은 없을 수 있습니까?” 대답했다. “어떻게 없을 수 있겠는가! 다만 도심으로써 주재를 삼으면 인심은 늘 명령을 듣게 된다.” (?)
기욕(嗜欲)을 지각함이 있으면서도 주재하는 바가 없으면 흘러서 되돌아감을 잊고서 근거하여 편안할 수가 없으니 위태롭다고 이른다. 도심은 의리의 마음(義理之心)이니 인심의 주재가 되고 인심이 근거하여 표준으로 삼는 것이다. 음식으로써 말하면 무릇 배고프고 목마를 때 마시고 먹는 것을 욕구하여 배부르고 만족함을 구하는 것은 모두 인심이다. 그러나 반드시 의리가 존재하니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다. (?)
- 미발이발(未發已發)과 중화(中和):
미발은 마음이 아직 사물에 감응하지 않아 사려가 싹트지 않은 상태.
이발은 마음이 사물에 감응해서 사려가 생겨난 상태.
중은 미발의 때에 사람에게 부여된 본성이 사욕과 같은 것에 은폐되지 않고 잘 보존된 상태.
화는 이발의 때에 정이 성에 따른 마음의 활동을 통해 절도에 맞게 발한 상태.
고요할 때는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사려가 싹트지 않아서 일성(一性)이 혼연하고 도의가 온전히 갖추어져 있으니 중(中)이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체(體)가 되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이유이다. 움직일 때는 사물이 번갈아 이르고 사려가 싹터서 칠정(七情)이 번갈아 작용하고 각기 주장하는 것이 있으니 화(和)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이 작용이 되어 느끼어 통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성의 고요함에 있어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고, 정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반드시 마음의 절도가 있다. 이것이 마음이 고요히 느끼어 통하고 두루 흘러 관철하는 것이며 체(體)와 용(用)이 처음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이다.
『중용(中康)』의 미발이발(未發已發)의 의미에 대해, 이전에는 이 마음이 유행하는 본바탕[體]을 인식하고, 또한 정 선생이 “마음은 이발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에 따라서 마음은 이발로, 성은 미발로 보았다. 그러나 정 선생의 글을 보니 많은 부분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반복해 생각해 보니 곧 전날의 설명이 심성(心性)의 명칭에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상의 공부에 본령이 온전히 없음을 알게 되었으니, 생각건대 잃은 것이 비단 문의적 맥락만이 아니다. 『문집(文集)』과 『유서(遺書)』의 여러 설을 고찰하면 모두 사려가 싹트지 않고 사물이 아직 이르지 않는 때를 가지고 희노애락의 미발이라고 여기는 것 같다. 이 때를 맞으면 이 마음은 적연부동한 바탕에, 하늘이 부여한 성의 본체가 갖추어지게 된다. 이것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고 치우치고 기울어짐이 없으면 중(中)이라고 이른다. 천하의 일에 감응하여 통하게 되면, 희노애락의 정이 발하여 마음의 작용을 볼 수 있는데, 중절(中節)하지 않음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으면 화(和)라고 이른다. 이것은 곧 인심(人心)의 바름이며 성과 정의 덕이 그러한 것이다.
성과 정은 하나의 사물인데, 그렇게 나뉘는 까닭은 단지 미발과 이발이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김병환 교수의 신유학 강의, p. 312)
정의 미발은 성으로, 이는 중이며, 천하의 대본이다. 성의 이발은 정으로 그 중절한 상태는 화이며, 천하의 달도이다.(김병환 교수의 신유학 강의, p. 312)
- 본래 마음은 허명함, 신령함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하나의 영상도 없다가, 사물이 다가오면 바야흐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비추어 보인다. 만약 어떤 영상이 먼저 그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비출 수 있었겠는가? 사람의 마음은 본래 깊고 고요하고 허명하여, 사물이 오면 따라서 감하고 응하여 자연히 높고 낮음과 무겁고 가벼움을 알고, 일이 지나면 곧 전과 같이 그 자리에서 허명함을 얻는다. (?)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신령하여 비록 천리 만리로 멀고 천 세대 백 세대의 전이라 하더라도 한 생각이 발하기만 하면 곧 여기에 이르니. 그 신묘함이 이와 같다. (...) 이 마음은 지극히 신령하여, 터럭이나 티끌과 같은 가는 틈새에도 지각이 있고, 우주의 커다람 속에도 있지 않음이 없다. 또 옛날과 지금과의 거리가 몇천 몇만 년이지만, 만약 이 뜻이 발하기만 하면 곧 여기에 이른다. 이러한 신명은 헤아릴 수 없으니, 그 지극히 허하고 지극히 신령 함은 천하에 으뜸이로다. (?)
- 기질을 바로잡는 것[교기질]이 수양의 목표
품수한 기질에는 비록 불선이 있으나, 성의 본래 선함을 해치지 않는다. 성은 비록 선하나 기질을 성찰하고 바로잡는 노력이 없을 수 없다. (?)
물었다. “기질이 좋지 않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하였다. “반드시 바로 잡아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만약 남이 한 번하면 나는 백 번을 하며, 남이 열 번을 하면 나는 천 번을 한다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총명하게 되고 비록 부드럽더라도 반드시 강해진다.” (?)
- 인설(仁說): 인은 사랑의 이치[愛之理], 마음의 덕[心之德],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 자연의 원리인 원형이정과 인간의 도덕적 본성인 인의예지는 상통함.
공(公)은 인(仁)을 체득하는 방법이고, 효제(孝悌)는 인의 작용이며, 서(恕)는 인을 베푸는 것이다. (?)
인이 성(性)의 덕(德)이요 사랑의 근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성에 인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정(情)에 능히 사랑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은 본래 내 마음의 덕이며, 사랑의 이치이다. (?)
인이라는 것은 천지만물을 일체로 보아 천지만물이 내 몸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천지만물이 자기 몸과 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인을 베푸는 것이 어느 곳엔들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는가? (?)
천지지심은 그 덕이 넷이니 원형이정(元亨利貞)이고, 사람의 마음에 네 가지 덕이 있으니 인의예지이다. (?)
원(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단예(端倪)이다. 원은 생의(生意)이니 형(亨)에 있으면 생의가 자라고 이(利)에 있으면 생의가 이루어지며, 정(貞)에 있으면 생의가 완성된다. 인(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다. 인은 본래 생의이니 곧 측은지심(側隱之心)이다. (?)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는 뜻이 가장 관찰할 만하다. 그러므로 낳는다는 뜻을 가진 원(元)이 모든 선의 으뜸이 되며, 인간의 경우엔 인(仁)에 해당된다. (?)
이 원이 사덕(원형이정)을 모두 관통하기 때문에, 정이는 “위대하도다 건원(乾元)이여, 만물이 이것에 힘입어 비롯되나니, 이 때문에 하늘을 거느리도다.”라고 했다. 하늘을 거느림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두루 유행하여 모두 하나의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인이 네 가지를 모두 통솔하여 의, 예, 지가 모두 인이며, 또한 네 가지 실마리에 있어서도 측은이라는 한 가지 실마리가 수오, 사양, 시비의 실마리를 모두 관통하여 총괄한다는 것이다. (?)
주자가 말하였습니다. 인(仁)이란 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요,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마음으로 삼은 것이다. 아직 발하기도 전에 사덕(四德)이 갖추어져 있는데, 오직 인만은 네 가지를 포괄한다. 그런 까닭으로 함양하여 기름이 혼연하여 통섭(通攝)을 하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생(生)의 성(性)이니, 애(愛)의 리(理), 인(仁)의 체(體)라는 것이다. 이미 발하였음에 사단이 드러나는데, 오직 측은(惻隱)만이 사단을 관통하고 있다. 그런 까닭으로 두루 흘러 관철하여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른바 성(性)의 정(情)이니, 애(愛)의 발(發), 인의 용(用)이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은 체(體)이고, 이미 발한 것은 용(用)이다. 부분적으로 말한다면 인은 체(體)이고, 측은은 용(用)이다. 공(公)이라는 것은 인을 체득하는 방법이니 ‘자기 자신을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라는 말과 같다. 대개 공적이면 인이 되고, 인이면 사랑하게 된다. 효제(孝悌)는 그 용이고, 서(恕)는 (仁)을 베푸는 것이며, 지각은 곧 지(知)의 일이다.
또 말하였습니다. 천지의 마음에는 그 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원(元)․형(亨)․이(利)․정(貞)이라 하며, 원(元)은 통섭하지 않음이 없다. 그것이 운행을 하게 되면 봄․여름․가을․겨울의 차서가 되는데, 봄의 생동하는 기운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되는데도 그 덕이 또한 네 가지가 있으니 인․의․예․지로 인은 포괄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것이 발하여져 쓰이게 되면 애(愛)․공(恭)․의(宜)․별(別)의 정이 되는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관통되지 않는 곳이 없다. 대체로 인이 도가 되는 것은 천지가 만물을 낳는 마음이 만물에 갖추어져 있어 정이 아직 발하기 전에 이 체가 이미 갖추어져 있고, 정이 이미 발하였다하면 그 용(用)은 다함이 없다. 실로 체득하여 보존할 수만 있다면 뭇 선의 근원과 온갖 행위의 근본이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이 공문(孔門)의 가르침이 반드시 학자들로 하여금 인을 구하는데 급급하게 하는 까닭이다. 그 말 가운데 “자기를 극복하여 예로 돌아가면 인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여 천리(天理)로 돌아가면 이 마음의 체가 있지 않음이 없고, 이 마음의 용이 행하여지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또 “가만히 있을 때는 공손하고, 일을 할 때는 공경스런 마음을 가져야 하여, 남과 교유를 맺을 때는 충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말 또한 이 마음을 보존하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어버이를 섬길 때는 효성스러워야 하며, 형을 섬길 때는 공손하게 한다.”는 것과 “남과 관계를 맺을 때는 서(恕)로써 한다.”라 한 것 역시 이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천지에 있으면 한없이 넓은 만물을 낳는 마음이요, 사람에 있어서는 따뜻하게 남을 사랑하고 만물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다. 이는 모두 사덕(四德)을 포괄하고 사단(四端)을 관통하는 것이다. (퇴계, 『성학십도』, 인설도)
3. 수양론
- 존천리거인욕: 마음속의 천리를 잘 보전하고(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리로서의 본성을 보존) 인욕을 없애도록(기질의 욕망을 제거) 노력해야 함. 그 방법으로 존양성찰과 거경궁리가 있음.
- 존양성찰: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함양하며[存養], 마음을 잘 성찰해서 인욕이 싹트지 않도록[省察](마음이 악으로 흐르지 않도록 반성하며 살핌) 해야 함
- 거경궁리: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경의 공부[居敬](천리로서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으려는 마음의 집중)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원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기 위한 이치의 탐구[窮理](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궁극적인 지식에 이르려는 격물치지)가 필요하다.
경[敬]: 마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잡념이 들지 않게 하기[주일무적],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엄숙한 태도를 유지하기[정제엄숙], 항상 깨어 있어서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상성성], 미발시 경으로 함양하고 이발시 경으로 성찰/찰식해야 함. - 이러한 도덕적 수양을 통해 성인에 이르게 됨(이상적 인간상)
이어서 경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씀하셨다. 성인의 말은 애초에 압축적이었던 적이 없다. 예를 들어 ‘문 밖에 나설 때는 큰 손님을 맞이하듯, 백성을 부릴 때는 큰 제사를 지내듯’이라고 한 것 등등이 그렇다. 이런 것이 모두 ‘경’의 항목들이다. 정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경’이라는 한글자로 압축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경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직 ‘삼가 조심한다[畏]’는 글자와 같다. 귀에 들리는 것 없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앉아 전혀 아무 일도 살피지 않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을 갈무리하고, 가지런히 통일하여, 방종하지 않는 것을 곧 경이라 이른다. (『주자어류』, 학6, 지수 75)
경은 모든 일을 손 놓고 관두는 것을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는 일마다 전일하며, 삼가고 두려워하여, 달아나게 놓치지 않는 것[풀어놓지 않는 것]일 뿐이다. (敬不是萬事休置之謂, 只是隨事專一, 謹畏, 不放逸耳.) (『주자어류』, 학6, 지수, 99)
내 들으니, 경(敬)이라는 한 글자는 성학(聖學)의 시작을 이루는 동시에 끝을 이루는 바탕이다. 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본원(本原)을 함양할 수 없고, 쇄소응대진퇴의 절목과 육예의 가르침을 삼가 행할 수 없다. 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총명함을 개발하거나 덕과 학문과 일을 닦아 나가지 못하고 명덕과 신민新民의 공효를 극진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까닭에 정이천 선생은 격물의 도를 밝히되, 반드시 경으로써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때를 지나쳐서 뒤늦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경에 힘을 써서 큰 것에 나아가되 그 작은 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에 방해되지 않을 수 있다면, 학문 진전의 방법에 있어 근본이 없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다. (?)
경(敬)이란 한 마음의 주재요, 만사의 근본이다. 그 노력하는 방법을 안다면 소학이 여기에 힘입어 시작됨을 알 것이다. 소학이 여기에 힘입어 시작되는 것임을 안다면 대학이 이것에 의지하여 끝맺지 않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니, 하나로 꿰뚫어서 의심이 없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 마음이 이미 서면 이것으로부터 격물치지하여 사물의 이를 지극히 하니 이른바 덕성을 보존하고 이에 따라서 묻고 배운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성의정심하여 그 몸을 닦으니 이른바 그 큰 것을 세우면 작은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제가치국해서 평천하에 이르면 이른바 자신을 수양해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독실하게 직분을 다하여 천하가 평안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루라도 경에서 떠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 경이라는 한 글자는 어찌 성학의 처음과 끝의 요체가 아니겠는가. (?)
대저 마음이 한 몸을 주재함에 있어서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사이나 말함과 침묵의 사이가 없이 지속된다. 이런 까닭에 군자가 경(敬)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움직일 때나 고요할 때나 말할 때나 침묵할 때나 힘을 쏟지 않는 때가 없다. 미발의 때에는 이 경이 진실로 존양(存養)의 결실을 세워주며,이발의 때에는 이 경이 또한 언제나 성찰하는 과정에서 유지된다. (?)
사람의 양지(良知)는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지만 궁리(窮理)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할 수 없다[궁리(窮理)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통달한 데 만족하여 아직 알지 못하고 통달하지 못한 것을 궁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궁리란 아는 바로써 모르는 것에 이르며 통달한 바로써 통달하지 못한 것에 이르는 것이다 人之良知,本所固有。然不能窮理者,只是足於已知已達,而不能窮其未知未達,故見得一截,不曾又見得一截,此其所以於理未精也 (『주자어류』, 대학오혹문하, 전오장, 獨其所謂格物致知者一段 12문)
함양하는 가운데 저절로 궁리가 있으니, 함양한 ‘이’를 궁구하는 것이다. 궁리 가운데 저절로 함양 공부가 있으니, 궁구한 ‘이’를 함양하는 것이다. 두 가지 공부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두 가지로 보면 얻을 수 없게 된다. (『주자어류』 ?)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誠意].’는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마는 것[毋自欺]이니, [악을 미워하기를]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처럼 하며, [선을 좋아하기를] 아름다운 색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이를 일러 스스로 만족한다[自謙]고 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홀로를 삼간다[愼獨]. 하지만 소인은 한가하여 나쁜 일을 행함에 못하는 짓이 없으면서 군자를 만나면 나쁜 일을 은폐하고 선한 척하지만, 남들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 君子 必愼其獨也) (『대학장구』 전6장)
생각이 싹트기 전과 사물이 이르지 않았을 때가 희로애락의 미발이다. 이 때에는 바로 이 마음이 적연부동한 본체로서 하늘이 명한 성(性)이 여기에서 발하니, 가히 마음의 작용을 볼 수 있다. 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고 어그러짐이 없으므로 화(和)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인심(人心)의 바름과 성정(性情)의 덕이다. 그러나 미발지전(未發之前)은 찾아볼 수 없고 이발지후(己發之後)는 안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단지 평일에 삼가 경으로 함양하는 노력이 지극해지고 인욕(人飮)의 사사로움으로 어지럽혀지는 것이 없게 하면, 그 미발은 명경수지와 같고 그 발함도 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바로 평상시의 본령 공부이다. (?)
사람이 공부를 함에는 천 가지 만 가지의 갈래가 있으나 어찌 본령이 없겠는가? 이것이 정 선생에게 ‘경을 지킨다(持敬)’라는 말이 있는 까닭이다. 다만 이 마음을 긴장시켜 밝게 빛나도록 한다면, 일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바가 없게 된다. 오래되면 자연히 강건해져 힘이 있게 된다. (...) 공부함에 대해 논해보면 반드시 큰 요체가 있으니, 정 선생이 하나의 경이란 글자를 추출해서 배우는 이들에게 말한 까닭이다. 요컨대 경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수렴해서 상자 속에 놓아두고 달아나지 못하게 한 연후에야 사사물물에 따라서 도리를 볼 수 있다. 일찍이 옛사람들이 학문에는 광명 속에서 밝은 것을 꽉 붙잡는다고 말한 것을 좋아했는 데 이 문구는 매우 좋다. 생각건대 마음 바탕은 본래 광명한 것인데 다만 이욕에 혼미해진 것이다. 지금 학문을 하는 방법은 요컨대 광명한 것으로 하여금 광명하도록 돌려놓는 것이다. (?)
물었다. “이른바 경(敬)이라는 것은 어떻게 공부해 가야 합니까?” 대답했다. “정자는 이에 대해서 일찍이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써 말했고, 일찍이 정제엄숙(整齊嚴肅)으로써 말했다. 그리고 그의 문인 사상채의 설명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상성성법(常惺惺法)이라 는 것이 있고, 윤화정의 설로는 심수렴불용일물(心收斂不容一物)이 있다. 이 여러 말을 관찰하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 (?)
지금 사람들은 경을 별개의 한 가지 일로 여긴다. 어찌 여기에서 꿇어앉아 주먹을 모으고 흙덩이처럼 한 연후에 경을 하는 것이겠는가? 지금 사람들은 경과 치지를 두 가지 일로 여기고, 경을 지킬 때에 단지 흙덩이처럼 홀로 앉아서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서, 도리어 오늘 경을 지키고 내일 도리를 생각하려 한다.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는가? 다만 한편으로 경을 지키면서, 한편으로 도리를 생각하는데 두 가지는 서로 방해되지 않는다. (?)
경은 눈을 감고 침묵하고 앉아서 경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일에 따라서 경을 지극히 해야 하니, 실행해 가는 곳이 있어야 한다. (...) 바야흐로 격물할 때를 맞아서는 경으로써 궁구하고, 성의할 때를 맞아서는 경으로 성실하게 한다. 정심과 수신 이후에도 절목마다 항상 각성하면서 경을 지켜야 한다. 이 마음이 항상 존재하게 한다면 능히 경을 지킬 수 있다. (?)
거경과 궁리는 함께 해야 함(상호보완 관계):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진실로 경을 위주로 해서 그 근본을 세우고, 이(理)를 궁구해서 그 지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근본을 세우도록 하면 지는 더욱 밝아지고, 지가 정밀하면 근본이 더욱 견고해진다. (?)
배우는 자가 궁리를 하지 않으면 도리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궁리를 하면서 경을 지키지 않으면 역시 안 된다. 경을 지키지 않으면 도리를 본 것이 모두 흩어져 버리고, 여기에 모이지 않는다. (?)
마음은 만 가지 이를 포함하고, 만 가지 이는 하나의 마음에 갖추어져 있다. 마음을 보존할 수 없으면 이를 궁구할 수 없고, 이를 궁구할 수 없으면 마음을 지극히 할 수 없다. (?)
학문하는 자의 공부는 거경과 궁리 두 가지 일에 있다.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발현한다. 능히 궁리할 수 있으면 거경 공부는 날로 더욱 진전하고, 능히 경에 머물 수 있으면 궁리 공부는 더욱 정밀해진다. 비유하자면 사람의 양쪽 발과 같으니 왼쪽 발이 가면 오른발은 멈추고 오른발이 가면 왼발이 멈추는 것과 같다. 또한 예를 들면 하나의 물건이 공중에 매달린 경우, 오른쪽을 누르면 왼쪽이 오르고 왼쪽을 누르면 오른쪽이 오르니, 그 실제로는 다만 하나의 일이다.
경은 의를 실천하는 토대:
경에는 죽은 경이 있고 살아있는 경이 있다. 만약 주일의 경을 고수하고, 일을 만나서 의(義)로써 다스리지 않고 그 시비를 변별하지 않으면 경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익숙해진 후에는 경에는 곧 의가 있고, 의에는 곧 경이 있다. 고요할 때면 경과 불경을 살피고 움직일 때면 의와 불의를 살펴라. 문을 나섬에 큰 손님을 보듯이 하고 백성을 부림에는 큰 제사를 받들듯이 하라는 것과 같은 것은 경하지 못하다면 어찌하겠는가? ‘앉을 때는 시동과 같이, 설 때는 재계하는 것과 같이 하라’와 같은 것은 경하지 않으면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경과 의를 함께 지키는 데에 순환이 끝이 없으면 안과 밖이 꿰뚫어진다. (?)
- 선지후행: 도덕적 지식을 먼저 알아야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다
사람이 어떻게 박학하지 않겠는가. 만약 박학하지 않고서 수신행기(修身行己)를 말한다면 맹렬하게 해 갈 수 없다.『대학』의 성의는 단지 ‘아름다운 여인을 좋아하는 것 같이’,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 같이’라고 말하였다. 수신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르러서는 자신이 스스로 관대해지고 만다. 그러니 후의 과정에 이르러서는 무슨 일이 되겠는가? 그 큰 근본은 다만 치지와 격물을 이해하는 것이다. 만약 치지격물하지 않고 곧 성의정심수신하게 되면 기질이 순수한 사람은 일개 견식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일 생각이 높고 넓은 사람은 인욕을 막아내지 못하고 모두 거꾸러진다. (?)
but 중행경지(重行輕知): 모든 공부는 궁극적으로 실천으로 귀결되어야 함
배움의 넓음은 앎의 요약함만 못하고 앎의 요약함은 행의 실질됨만 못하다. (?)
성현이 사람을 가르침에 반드시 궁리를 우선으로 삼고 역행으로 마무리했다. (?)
대저 학문함에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이 이를 밝혀서 역행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
- 지행병진(지행호발): 도덕적 지식의 탐구와 실천이 함께 나아가야 함(궁구하여 터득한 지식을 현실 속에서 실천할 것을 강조)
지(知)와 행(行)은 항상 서로 의존한다. 마치 눈이 있어도 발이 없으면 다닐 수 없고, 발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선후를 논하면 지가 우선이고, 경중을 논하면 행이 더 중요하다. (知行常相須,如目無足不行,足無目不見。論先後,知為先;論輕重,行為重) (『주자어류』, 논지행, 1)
지(知)와 행(行) 공부 …… 이 두 가지는 모두 어느 한쪽을 없앨 수 없다. 이는 마치 사람에 있어서 두 발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 내딛는 것과 같으니, 만약 어느 한쪽 발이라도 성치 못하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다. …… ‘지’가 밝아질수록 ‘행’은 더욱 돈독해지고, ‘행’이 돈독해질수록 ‘지’는 더욱 밝아진다. (『주자어류』 ?)
선이 저기에 있으면, 스스로 그것을 행해야 한다. 행함이 오래 되면 선은 자신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면 곧 나에게 얻어진 것이다. 아직 행할 수 없으면 선은 그대로 선이고 나는 그대로 나일 뿐이다. (?)
비록 앎을 지극히 해야 하지만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된다. 『서경』에 이르기를 앓은 어렵지 않으나 행이 오히려 어렵다고 했으니, 공부는 오직 행에 있다. (?)
만일 궁행(躬行)할 필요가 없다면 다만 말하기만 하면 끝이다. 그러니 공자의 70제자의 경우도 이틀간 말하면 되는데 수년 동안 공자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공부한 것은 그들이 무능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에 익히고 사업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실천력을 얻기 위해서다. (?)
치지와 역행에 있어 노력함이 치우쳐서는 안 된다. 한 편에 치우치게 되면 한 편은 병을 얻는다. 예를 들어 정자가 말하기를 함양은 반드시 경으로써 하고, 학문의 진전은 치지에 있다고 하여 양각설(雨脚說)을 지었다. (?)
- 격물치지: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끝까지 탐구함으로써 지극한 앎을 이루어야 함. 도덕 법칙이 내재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이루어 나갈 것(천지 만물에 담긴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 도덕 법칙의 탐구)
근간에 내 일찍이 정자程子의 뜻을 속으로 취하여 빠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보충하였다. “이른바 ‘지식을 지극히 함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致知在格物].’는 것은 나의 앎을 지극히 하고자 한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대개 인간의 마음은 영특하여 지각을 가지고 있고 천하의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오직 사람들이 그 이치를 다 궁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앎이 극진하지 않다. 이 때문에 대학大學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이미 알고 있는 리(理)에 근거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 지극한 데(極)까지 이르도록 하려 한 것이다. 오랫동안 힘써 나아가면 어느 순간 확 트여 관통하게[豁然貫通] 된다. 그러면 모든 사물의 표리表裏와 정조精粗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全體와 대용大用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격물(物格)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의 지극함이라 이른다. (閒嘗竊取程子之意 以補之 曰 “所謂致知在格物者,言欲致吾之知,在即物而窮其理也。蓋人心之靈莫不有知,而天下之物莫不有理,惟於理有未窮,故其知有不盡也。是以大學始教,必使學者即凡天下之物,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以求至乎其極。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則眾物之表裏精粗無不到,而吾心之全體大用無不明矣。此謂物格,此謂知之至也) (『대학장구』, 6)
격은 이른다[至]는 것이고, 물은 일[事]과 같다.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 (格 至也 物 猶事也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 (『대학장구』 ?)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치가 있다. 격물이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격물에는 하나의 방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혹문』 ?)
격물이란 오직 한 사물에서 그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지란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해 나가면 나의 지식도 지극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이다. (格物只是就一物上窮盡一物之理, 致知便只是窮得物理盡后, 我之知識亦無不盡處) (『주희집』 권51 답황자경 ?)
'치지(致知)'란 무엇인가? 반드시 알기를 극진히[盡]해야 하니(끝까지 추구하여 알되) 더욱더 익숙하고 절실하게[親切]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지지(至知)’를 보고 여서기서의 이르다[至]는 곧 다하다[盡]는 해석을 취했는데 근래에는 합하여 ‘간절히 두루 미친다[切至]’는 두 글자의 ‘지[至]’의 의미로 여겨진다. 아는 것에 절실하게 한 연후에 성의(誠意)를 관통해 나간다는 의미다. 정선생이 소위 진지(眞知)라 했던 것과 같다. (致知者,須是知得盡,尤要親切。尋常只將『知至』之『至』作『盡』字說,近來看得合作『切至』之『至』。知之者切,然後貫通得誠意底意思,如程先生所謂真知者是也。) (『주자어류』, 대학2, 경하, 88)
대저 하늘이 만백성을 낳을 때 물(物)이 있으면 법칙이 있다. 물이란 형체요, 법칙이란 이치이다. 형이란 형이하의 것이요, 이란 형이상의 것이다. 사람이 태어남에 진실로 능히 이 물이 없을 수 없는데, 그 물의 이를 밝히지 못하면 성명(性命)의 올바름에 순응하지 못하고 사물의 마땅함에 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물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 그 이를 구할 줄 알아도 물의 극진함에 이르지 못하면 물의 이를 다 궁구하지 못하게 되어 나의 지식도 또한 다하지 못함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극진함에 이르고 난 이후에야 그치는 것이다. 이것이 ‘격물’이라 이르는 것이니, 물에 나아가서 물의 이를 다하는 것이다. (?)
치지는 나로부터 말하는 것이고, 격물은 물에 나아가 말하는 것이다. 만약 물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무엇으로써 앎을 얻겠는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중에 그 아는 것을 미루어 극진히 하는 이는 있으나 다만 평범하게 그 심사를 다할 뿐 모두 사물에 나아가 궁구하지 않으니, 그렇게 해서는 끝내 머무를 곳이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아는 것을 극진히 하여 저 사물에서 미루어 궁구해 가면 나에게 바야흐로 아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
치지(致知)는 지극한 곳까지 미루어 나아가되, 투철하게 궁구하여 단연코 이러하다는 것을 참으로 아는 것이다. (...) 치지는 진지(眞知)를 구하는 바탕이다. 진지는 뼈에 사무치도록 투철하게 알아내는 것이다. (?)
4. 대학 삼강령 해석
1) 명명덕
- 명덕은 마음이 얻은 덕, 본연지성.
천하의 만물이 된 것은 형기의 치우치고 막힘에 질곡되어 그 본체의 온전함을 확충할 수가 없다. 오직 사람이 태어남에 그 기의 바르고 통명함을 얻으니, 그 성이 가장 귀한 것이 되어 그 마음이 텅비고 신령스럽고 밝아서 온갖 이를 갖추고 있다. 생각컨대 사람이 금수와 다른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요임금과 순임금이 될 수 있고 천지에 참여하여 화육을 도울 수 있는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서 명덕(明德)이라 한다.
그러나 그 기의 통명함도 간혹 밝고 흐림[淸濁]의 차이가 없을 수 없고, 그 기운의 바름도 간혹 좋고 나쁨(美惡)의 차이가 없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부여받은 기질이 맑은 사람은 지혜롭고, 흐린 사람은 어리석으며, 기질이 좋은 사람은 현명하고 나쁜 사람은 불초하여 같지 않은 점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지(上智)와 대현(大賢)의 자질이 있어야 그 본체를 온전히 해서 조금도 밝지 않음이 없다.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밝은 덕이라는 것이 이미 가려지지 않을 수 없어 그 온전함을 잃게 된다. 하물며 기질로써 가려진 마음이 사물의 끊임없는 변화에 접하여, 눈은 색을 욕망하고, 귀는 소리를 욕망하고, 입은 맛을 욕망하고, 코는 냄새를 욕망하고, 사지는 안위을 욕망함으로써 그 덕을 해치는 것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가 서로 원인이 되어 반복적으로 깊이 고착되어, 이 때문에 덕의 밝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 혼미해지니, 이 마음의 영명함으로도 아는 것이라곤 고작 정욕과 이해의 사사로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에 비록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금수와 다를 바가 있겠는가? 비록 요순이 될 수 있고 천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다.
(...) 대저 먼저 밝음의 실마리를 열어주고 거기에 그 밝음의 실질을 지극히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얻어서 밝지 않음이 없는 것이 어찌 초연하게 기질과 물욕의 가리움을 제거해서 그 본체의 온전함을 회복할 수 없겠는가! 이것이 곧 명덕을 밝힘(明明德)인데, 성분(性分)의 밖에서 작위하는 것은 아니다. (?)
2) 신민
- 『대학』의 ‘친민’을 ‘신민’으로 해석함. 신민은 자신의 명덕을 밝힌 후, 그것에 미루어 기품과 인욕에 의해 가려진 백성들로 하여금 나쁜 풍습에 물든 때를 버리게 하여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3) 지어지선
- 지어지선을 사리의 당연함의 극치에 이르러 옮기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지(止)는 반드시 거기에 이르러 다시는 옮겨갈 수 없다는 뜻이다. 지선(至善)은 사리의 당연함의 극치이다. 이는 밝은 덕을 밝히는 것(明明德)과 백성을 새롭게 함(新民)을 모두 지극한 선이 있는 곳에 그쳐 다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도록 함을 말하니, 이는 반드시 그 천리의 지극함을 다하며 털끝만큼도 인욕의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
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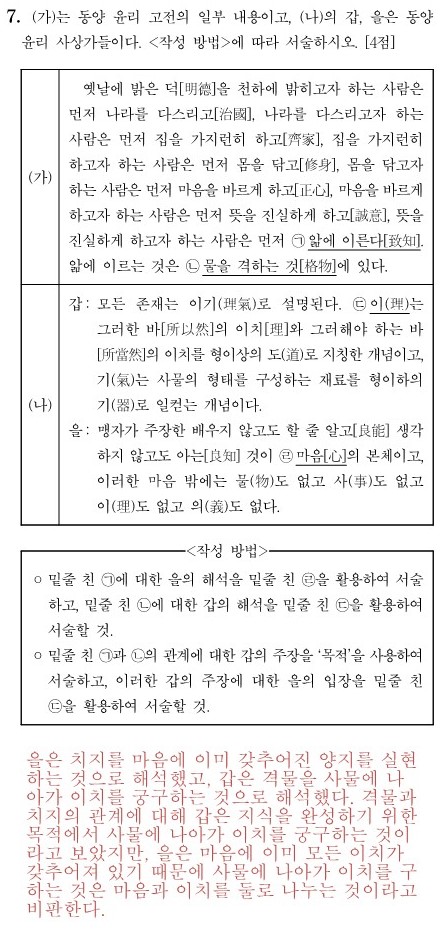
'임용고시 서브노트 > 동양윤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윤리 (6) 이황 (0) | 2024.05.11 |
|---|---|
| 동양윤리 (5) 왕수인 (0) | 2024.04.06 |
| 동양윤리 (3) 순자 (1) | 2024.01.24 |
| 동양윤리 (2) 맹자 (2) | 2024.01.14 |
| 동양윤리 (1) 공자 (4) | 2024.01.12 |